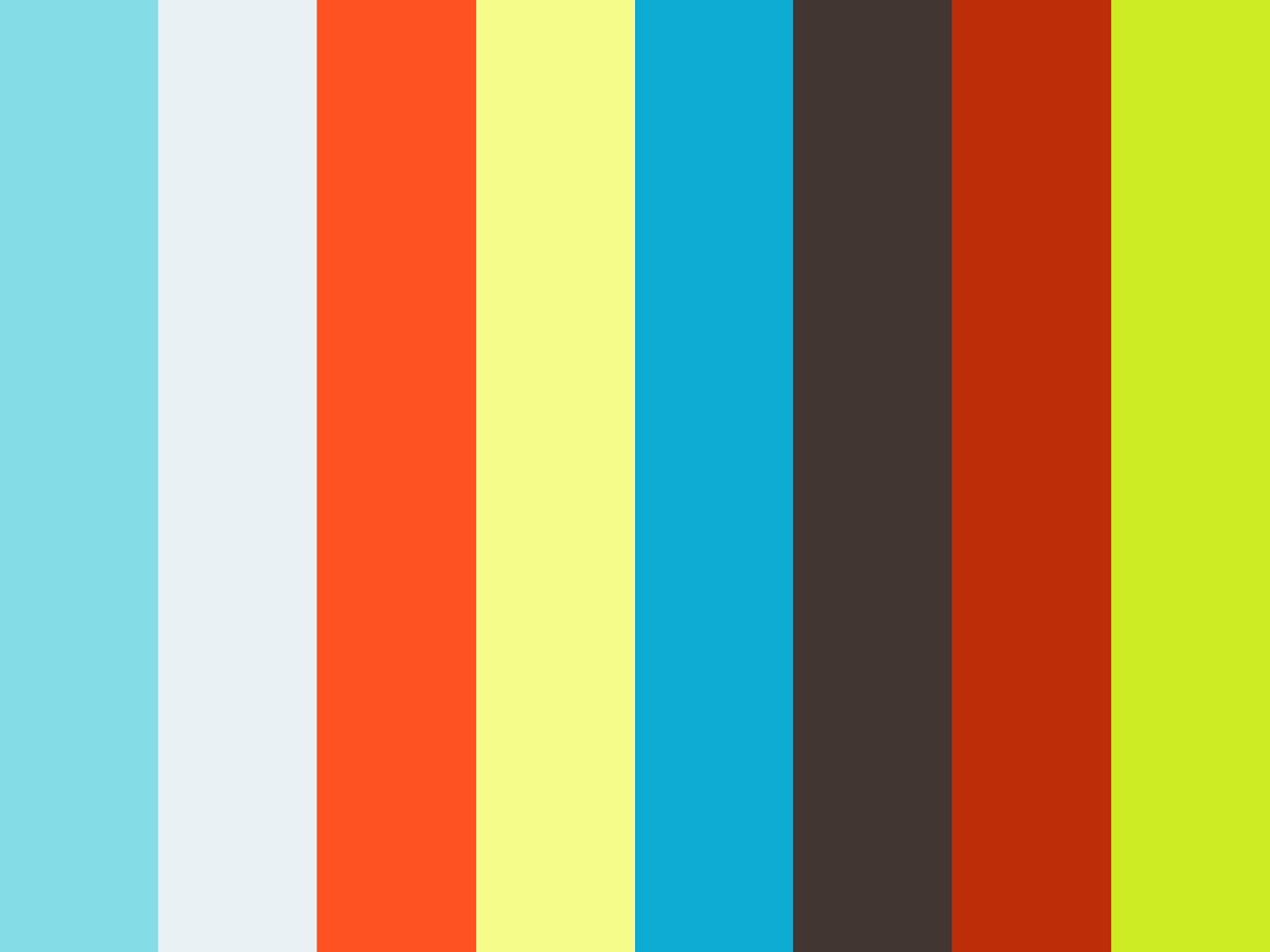Solo Exhibition
2011. 10. 19 - 10. 25
Gallery IS, Seoul, Korea
물의 힘으로 키운 불의 상징 -김은진의 나무조각과 미학적 통로 상에서 불의 상상으로 ● 묶인 나무가 있다. 꼼짝할 수 없는, 통째로 묶여서 도무지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무. 무릎 꿇고 앉은 수인(囚人), 온 몸을 옥죈 뒤 처형의 이슬이 된 나무수인이 있다. 선명하게 잘린 목이 참혹했다. 몸이 나무에 갇혀 나무인지 몸인지 분간할 수 없고, 참혹의 형상을 내 것으로 전율할 수 없어 숨이 탔다. 큰 통나무를 파 들어간 칼의 구조가 '묶임'의 세목이라면, 그 세목의 내부형상이 무릎 꿇고 포박당한 이름 모를 어떤 이다. 그는 흔들림 없이 정지해 있고 고요한 듯 가볍게 앉아있다. 숨이 타는 수인의 형상과 고요한 정지 사이에서 비평을 향한 문자는 현기증이 났다. 문득, 목 잘린 수인의 참혹이 소신공양의 몸짓으로 상승했다. 알 수 없는 반열(班列)에서 몸짓은 숭고했고, 생각은 꼬리 없이 치달아 김동리의 「등신불」에 가 닿았다. 숨 타는 형상과 정지 사이의 숭고한 몸짓 때문이었으리라. 등신불은 부조리한 불상이다. 타다 만 몸에 금물을 입힌 처연한 등신불은 그 자체로 형상의 부조리였고, 그것은 번뇌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번뇌는 살아서 만연한 부조리였을 뿐 공양의 화염 속에서는 숭고로 빛났다. 김동리의 「등신불」과 김은진의 「갇히다」는 시각적 충격이 던지는 미학적 속도나 파장과 상관없이 '숭고의 무게'를 사유케 한다. 둘 다 사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주체화 될 수 없는 형상들이지만, 줄에 묶이고 금물에 입혔으나 묶이고 입힌 그 몸짓이 숭엄하지 않은가. 확인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부조리의 속이 뒤틀리고, 뒤틀린 속의 형상을 육하(六何)로 표현할 수 없어 기묘했다. 기묘한 몸짓과 말의 통각이 섞여서 숭고의 무게를 만들고 있다. 김은진의 작품은 나무다. 나무를 깎아 형상을 구현했다. 오행(五行)에 따르면 물이 나무를 낳지만, 나무는 불을 낳는다. 김은진의 나무에서 물이 현실이라면 불은 초현실이다. 이때 현실/초현실과 물/불의 이중성은 나무형상의 미학적 구조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미학적 구조는 현실이라는 삶의 세계인데, 삶은 그의 세계로서 그가 살아가는 시공간과의 동시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의 은유를 갖는다. 미학적 상징은 초현실로서 현실과 시차를 갖는 상징계이다. 상징계는 불의 은유를 갖는다. 김은진의 작품은 이렇듯 현실/초현실, 물/불로서 삶과 상징계의 이중구조 사이에 존재하며 그것들은 서로 공존한다. 「갇히다」에 대해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맞닥뜨릴 수 없다. 사회와 부딪혀 상처투성이가 된 후 애써 하나의 막이라도 둘러보지만, 나를 보호해 주리라 여겼던 막은 어느 새 무거운 짐으로 변해 버리고, 오히려 묶어 놓은 줄은 자신을 파고든다."고 고백했다. 상처투성이의 현실이 삶이라면 그 삶으로부터 길어 올린 '묶인 형상'이 그의 작품이다. 그리고 나무는 참혹한 고통의 형상에서 기묘한 불의 상상으로 사유를 전유시키며 숭고를 획득한다. 물에서 나무, 나무에서 불로 이어지는 그의 작품세계는 그래서 아직 미완의 단계이지만, 선명하다.
화심(火心)이 생동하는 불의 상상력 ● 묶인 나무가 있다. 꼼짝할 수 없이 통째로 묶여서 도무지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무. 대지를 뚫고 솟아 오른 나무는 살아서 기진했고 죽어서 해방되었다. 나무의 일생은 모순이 들끓는 현실로 고스란하다. 사방으로 기울며 힘차게 밀어올린 신체의 굽이굽이가 터져서 아물었고, 아문 옹이 주변으로 가지가 뚫고 자랐다. 굽이친 옹이와 가지 사이를 벌리면서 나무는 자란 듯했다. 작가는 나무의 속이 궁금했다. 속을 알 수 없어 육하의 언어를 구성할 수 없었던 「갇히다」와 달리 「비틀리다」는 껍질을 까고 속으로 파 들어가 나무의 실체에 접근했다. 잘게 더듬어 가며 외피를 깎아 들어간 그는 해부학에 노출된 근육인양 몸을 친친 감고 있는 단단한 밧줄을 발견한다. 나무여서 아름다웠고 아름다워서 자연으로 비약할 수 있었던 나무의 실체가 속박이라니!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였을 터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되었을 터이다. 영하의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지상으로 밀고 가는, 막 밀고 올라가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온몸으로 자기가 되었던 나무. (황지우의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를 변용했다.) 김은진의 현실은 온몸이 자기가 되었던 나무의 생애와 겹친다. 그는 "속박의 흔적이다. '나'라는 주체는 이미 외부의 억압에 침식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촘촘한 줄 사이로 돋아난 옹이는 나를 규정짓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안간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속박과 안간힘 사이에서 나무는 온몸으로 자기가 되었을 것이다.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물의 힘이요 불의 상상이다. 불을 키우는 물의 힘! 그에게서 물과 불은 상극이면서 또한 상생이다. 과거, 독재의 현실이나 지금, 민주의 현실에서조차 현실은 모순이요 부조리다. 모순과 부조리에 갇힌 현실은 모순을 제도화하고 부조리를 강제한다. 삶이 그 속에서 들끓는 이유다. 김은진은 언제나 지금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삶의 주체들을 다룬다. 그 주체의 표정은 나무를 통해 드러난다. 나무를 통하는 알레고리의 근원에 '화심(火心)'이 있다. 그 화심이 생동하는 불의 상상력이며 이는 그의 작품에 깊게 내장되어 있다. "개인의 욕망, 자유로운 주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 낯선 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아니 그저 충성스러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임을, '나다움'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억압의 무게를, 그리고 그 아래 억눌린 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싶었다."
세계와 세계의 투쟁, 아수라의 현실 ● 나는 다시 「아물다」를 본다. 나무는 알이다. 알의 형상이다. 알의 주인이 쏙 빠져서 달아나고 없는 빈 알이다. 알들은 남아서 환(幻)의 세계를 비춘다. 생명이 터져서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와 한 세계를 연 환. 환의 세계는 죽어서 비었으나 비어서 가득 찼다. 김은진의 현실은 알의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존재한다. 안에 존재하나 밖으로 열려 있다. 헛보이는 모든 세계가 곧 환이니 이 현실 또한 환일 터. 내 현실이 안의 현실이라면 나를 둘러싼 사회현실이 밖의 현실이다. 그러니 안팎의 두 현실이 알을 둘러싼 환의 실체일지 모른다. 새로운 세계로, 신의 세계로 날아 간 아브락사스(abrasax)의 신화는 초현실의 상징이지만 「아물다」에서는 지극한 현실의 고통스런 표정일 뿐이다. 물질이 악하고 영혼이 선하며 구원은 오직 비밀스런 지식, 즉 그노시스에서 온다고 믿었던 영지주의의 신화는 그러므로 지상에 추락한 신화라 할 것이다. 나무 알은 물질로서 선하고 그 영혼은 환에 불과하지만 구원은 오직 환의 세계에서 온다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은진은 "알의 내부에는 밖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충만한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껍질은 외부로부터 그 힘을 보호하기 위한 방벽이지만, 동시에 그 힘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결국 지금의 삶은 이 '벽'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끊임없는 다툼"이라고 했다. 그의 알은 세계에서 세계로 나아간 신화의 상징이 아니다. 그의 알은 세계와 세계가 대결하는 투쟁의 장이며, 아물고 터지기를 지속하는 아수라의 현실이다. 그의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의 전모를 드러낼 때 그 현실은 아수라의 응고된 뼈를 모아 놓은 듯 숭고하다. 「버려지다」의 빈 입속에도 현실을 쉽게 월경하지 못하는 힘듦이 있고, 몇 개의 연작도 그 안에서 맴돈다. 힘들고 맴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물의 힘으로 키워 올린 불의 심부를 엿보는 것이다. ■ 김종길